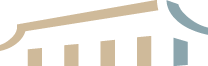<열녀춘향수절가>
: 춘향의 혁명적 판타지 텍스트
유광수(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사진 : 『烈女春香守節歌』 (한은 163)
| 억지를 부리는 춘향과 속 터지는 변학도 |
<춘향전(春香傳)>의 변학도는 사실 잘못이 없다. 조선시대 현실을 감안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물론 변학도가 탐학무도(貪虐無道)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징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면 그가 매도당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춘향을 탐했기 때문이다.
“뭔 소리여! 지방관이란 작자가 남원에 내려오자마자 한 짓이 기생점고(妓生點考) 같은 것인데, 그게 제대로 된 거여?”
이런 날 선 비난은 우리 감정에 맞기는 하지만 온당한 비판은 아니다. 기생점고는 꼭 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구든 임지에 신임으로 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인수인계, 즉 ‘지방관의 업무’였다.
신임관리는 지역 현안, 추진 사업, 민심 동향 등은 물론이고, 병장기를 비롯한 각종 기물, 소속 인력, 관청 살림살이들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 확인 절차에 관기(官妓)들도 포함된다. 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은 엄연한 국가의 재산이었으니 점검은 필수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그렇다 쳐도… 춘향이는 관기가 아니잖아? 그런 여자를 오라가라 하는 게 옳단 말이야?”
물론 춘향은 관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방관이 부르면 냉큼 달려가야만 한다. 신분제 사회였던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계급사회가 아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냉혹하고 엄연한 현실이다.
춘향은 은퇴한 기생[退妓] 월매의 딸이다. 그러니 천민(賤民) 중에서도 가장 밑의 신분인 것이 맞다. 아버지가 양반이든, 참판이든 상관없이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종모법(從母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생인 모친 신분을 따라 천한 신분이 분명하다. 그녀를 응원하든 않든, 그녀를 좋아하든 않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 ‘춘향(春香)’이란 이름부터 ‘봄의 향기’라는 노골적 의미다. 천한 신분이니 당연히 성(姓)은 없다. 대다수 판본이 그렇다. 그런데 몇몇 판본에 따라 ‘성’춘향인 경우도 있고, ‘김’춘향인 경우도 있다. 춘향을 좋아하던 당대 사람들이 그녀에게 성(姓)을 부여한 것이다. 천한 기녀의 딸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이 때문에 <춘향전>을 둘러싼 이야기에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는 일이 빚어지게 되었다.
계급사회의 정점에 선 양반이, 그것도 한 마을의 관장인 사또가 부르면 그 누구든 가야 한다. 양반들도 그러해야 하는데 하물며 평민도 아닌 천민은 말할 것도 없다. 계급사회가 아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괴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춘향을 데려오라는 변학도의 명령은 이상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거였다.
그렇게 불려나온 춘향이는 변학도와 실랑이를 벌인다. 정확하게는 억지를 부리는 춘향과 기가 막혀 하는 변학도 사이의 악다구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춘향은 “소녀가 비록 천한 몸이오나, 어려서부터 예법은 알아….” 어쩌고 하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소리를 연신 늘어놓으며 지방관인 사또의 수청(守廳)을 거절한다. ‘지아비가 있으니 수청을 못하겠다’는 핑계는 방자함과 망발의 극치다. 변학도 입장에선 속에서 천불이 날 소리다.
예법은 양반 부녀자의 것이지 천한 기생 딸년의 것이 아니다. 또한 아무리 예법을 안다 한들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전임 사또의 자제와 혼인관계라는 말은 그야말로 억지다. 그냥 사또 자제가 ‘데리고 놀다 버리고 간 신세’라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공식적으로 혼인을 한 적도 없고 첩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 단지 춘향 혼자서만 지아비라고 우기는 거다.
변학도 입장에선 춘향의 항거는 지방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췰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다. 그러니 변학도는 춘향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감찰관리가 그를 탐관오리(貪官汚吏)라며 봉고파직(封庫罷職)을 시켜 버리지 않는가. 그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감찰관과 고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위의 동료 관리들까지 모두 똘똘 뭉쳐 그를 추잡하고 파렴치한 족속으로 몰아붙였다.
맞다.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이몽룡은 춘향의 옛 정인(情人)이었다. 이몽룡은 정당한 국가 권력 행사를 빙자해서 변학도를 징치했고, 자신의 정인 춘향만 쏙 빼내서 데려갔다. 그가 남원 고을에 출도해서 한 일이라고는 단지 그뿐이었다.
| “내가 아니어도, 너라도 제발…!” |
변학도의 억울함 말고도, 따지고 보면 <춘향전>의 무리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암행어사가 된다는 것도 그렇다. 왕명을 받아 민정을 시찰하는 암행어사를 생판 초짜 관리에게 시키지는 않는다. 4~5년 정도 훈련된 관리에게나 어사를 제수하는 것인데, 그걸 급제한 이몽룡이 대뜸 받는다.
걸린 시간도 그렇다. 변학도가 남원에 내려와서 춘향을 못살게 굴다가 목을 잘라 죽이려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시간은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그동안 과거가 열리고, 시험을 치고, 급제해서, 삼일유가(三日遊街)를 비롯한 온갖 인사를 여기저기 다니고, 임명을 받고, 부랴부랴 남원으로 내려와서, 죽기 직전의 춘향을 구해낸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허겁지겁 정신없이 아슬아슬하게 성공한다. 소설이라지만 좀 많이 심하다.
사실 이런 설정은 당시 실제 상황에도 벗어난다. 자신의 연고지를 피해야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있어 남원 지방 암행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몽룡은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대뜸 내려온다. 그러고는 앞서 말했듯 춘향만 콕 찍어 구해낸다. 관료로서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단지 자기 정인만 구출해 내다니, 권력남용이 따로 없다.
그런데 임금은 이런 춘향을 크게 표창해서 첩이 아닌 처(妻)가 되게 하고 심지어 정렬부인(貞烈夫人) 직첩까지 내린다. 그야말로 엄청난 무리수의 연속이다.
이런 억지들에 비하면, 예전 사귀었던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는 이몽룡이나, 지아비라고 우기며 목숨까지 거는 춘향의 사랑 정도는 애교스러울 지경이다. 그럴 수도 있단 생각이 든다. 인간의 마음이야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말이다.
바로 이런 무리수와 억지에 <춘향전>의 혁명성이 있다.
<춘향전>이 고전 중에 고전인 이유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바로 아무도 묻지 않은 근본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고, <춘향전>을 향유한 사람들은 그 물음에 진지한 대답을 했다.
춘향이 변학도에게 발악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 않았다. 수청 거절이 황당한 일이란 것도 알았다.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도, 남원에 내려와 구출해내는 것도, 그리고 정렬부인으로 삼는 것도,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걸 너무나도 잘 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판타지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는 거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다. 자신들은 비록 질곡에 묶여 있지만 춘향만은 벗어나서 훨훨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춘향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매정하게 도련님이 떠난 후 그녀에게 괴로움이 닥쳤다. 좋다. 그래 이미 버린 몸, 변학도에게 바치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놈이 간 다음은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놈이 올 거고, 그 놈도 또 다시 또 그럴 거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또, 또, 또…,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어떻게 될까? 그녀다움은 어디로 가 버릴까? 아니 애초에 그녀다움이란 게 있기나 한 것일까
그랬다. 춘향은 이 놈(이몽룡) 저 놈(변학도) 찝쩍대고 괴롭히고, 어떻게든 단물만 빼먹고 버리려는 이 황망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 우겼다. 떼를 썼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며 바락바락 대들어야만 겨우 제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랬다.
춘향의 발악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알았다. 그렇게 버티는 안쓰러움을 눈물 섞인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번 씹다 버린 껌을 다시 입에 넣을 리 없지만, 그 고귀한 양반 도령께서 암행어사씩이나 되어 춘향을 구출하러 내려올 리도 없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정렬부인이 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게 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 것이다. 그렇게 <춘향전>이 만들어졌다.
남원 사람들은 모두 다 춘향이 감옥에서 고생할 때 같이 애달파했고 슬퍼했고 통곡했다. 춘향이 서울로 올라가자 그 모두 자기 일인 것 마냥 신이 나서 기뻐했다. 무슨 혜택이 돌아가서가 아니다. 춘향이처럼 자신들도 잘 될 거라고 믿어서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한 마음이었다. 그녀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비록 나는 아니어도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라’는 열망, 그것이 바로 <춘향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춘향전>을 읽고 듣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이것이 <춘향전> 혁명성의 본질이다.
| 춘향은 이몽룡이 돌아올 것을 믿었을까 |
춘향이 이몽룡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다. 사랑한 것도 진실이다. 다만 자신은 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똑똑하고 명민한 만큼 그녀는 잘 알았다. 그래서 판본에 따라, 첫날밤에 이몽룡에게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각서, 불망기(不忘記)를 써 내라고도 한다.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이별하게 되었을 때 그 불안함이 절절하게 드러난다. 춘향은 이몽룡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정말 이몽룡이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까? 현실적으로 가장 그럴 듯한 바람은 이몽룡이 급제해서 관리가 된 후 자신을 첩으로 부르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것이 똑똑한 춘향이 생각한 최상의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다. 이몽룡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도 기생이 있고,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급제하면 여기저기 연줄을 넣어 인연을 맺고자 하는 여인들도 많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넘어야할 난관이 참 많다. 그런데 이몽룡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낸다.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춘향은 그가 해낼 줄 확신했을까? 떠난 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믿었을까
이 질문이 <춘향전>과 춘향을 제대로 보게 하는 핵심이다.
춘향이 놓인 상황은 정절을 강요받는 상황이 아니다. 이몽룡이 정절을 지키라 하지 않았다. 했다면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헤어지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다. 이몽룡이 남다른 인물이기에 돌아왔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춘향이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일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들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게도 이몽룡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당시 천민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짓이었지만, 춘향은 그것을 했다. 중세적 가치인 ‘정절’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스스로 객체화시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스스로 정한 주체로써 정절을 지킨 것이다.
이 정절의 실체는 이몽룡이 돌아올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돌아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주체적 판단에 의해 지킨 정절이다. 문제는 춘향이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신분이고 여성이고 상황이지만, 그녀는 그랬고 해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춘향의 실체이다.
판소리에서 연원한 <춘향전>은 소설로도 <춘향전>, <별춘향전>, <열녀춘향수절가>, <남원고사>, <옥중화>, <대춘향전>, <이설춘향전> 등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이중 ‘열녀춘향수절가’는 목판 인쇄를 한 이본으로 <춘향전> 확산에 지대한 공이 있었고,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텍스트로 다루어졌다. 무엇보다 그 제명에 ‘열녀 춘향’을 내세웠던 것도 그렇다. 정말 의미심장한 명칭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이윤석, 2009 『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설성경, 2004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